알림센터
- 가장 달콤했던 여름
- [자원봉사활동수기 | 201503 | 주은정님] 가장 달콤했던 여름

매미가 한창 울어대던 지난 여름, 서울역에서였다.
“약 좀 줘.” “아버님, 술 드시고 오시면 진료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음주하지 마시고 다시 와주세요” “야 니 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우당탕탕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리며 소독기구들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지나가는 행인 분들이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태연한 듯 소독기구들을 주워담았다.
사실 무섭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이러다 한 대 얻어맞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잠시 스쳐갔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아버님은 “지금 노숙인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되풀이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음주 후에는 혈압이 올라 정확한 혈압을 잴 수 없다는 것, 술과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약들도 있어 위험하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드렸다.
안 그래도 찜통처럼 더운 날씨에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상황이라 얼른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진료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 믿었기에 그냥 내쫒듯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시원한 물을 한잔 가져다 드리며 “날이 너무 더워서 아버님 힘드셨나보다. 너무 덥죠?”라고 먼저 밝게 말을 걸었다.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그제야 화가 좀 가라앉으셨는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셨다.
젊은 시절의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었는지부터 이야기는 시작됐다. 어느 날 한순간 무너지게 된 위기, 가족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저린 이야기, 결국 노숙을 하게 된 이야기까지 흘러갔다. 마치 한 편의 슬픈 영화가 완성되는 듯 했다.
이야기를 하시다말고 자랑할 것이 있다며 주머니를 살피셨다. 사랑하는 딸의 사진이라며 꼬깃꼬깃해진 사진을 꺼내어 보여주셨다

“못 본지 너무 오래됐어. 참 예쁘지 내 딸.”
우리가 그저 ‘노숙인’이라 칭했던 그 분들도 한분, 한분 각자의 소중한 삶이 있었고, 소중한사람들과 함께했었던 분들이라는 생각을 그 때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매 주 진료소에 나가면서도 한분, 한분을 알기보다는 그저 노숙인 분들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가곤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식이었고, 사랑하는 배우자였으며, 존경하는 부모였을 분들.......노숙인이라는 한 단어로 담을 수는 없는 것들이라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술이 완전히 깨진 않으셨지만, 소독기구를 내던지시며 화를 내셨던 분이지만, 이야기를 마치신 뒤 아버님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그 화는 절대로 진료를 도와주는 어린 학생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 분도, 나도 알고 있었다.

노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고 보듬기보다 무시하는 사회에 대한, 그리고 무능하게 느껴지는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는 걸.
진료소가 끝나 뒷정리를 다 마치고 해산할 무렵, 저 멀리서 아까 그 아버님이 쭈뼛쭈뼛 하시며 다가오셨다. 그러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초코우유 한 병을 수줍게 내미시며 말씀하셨다.
“고생했는데, 이거라도 받아.” 이걸 받으면 아버님은 오늘 저녁 배가 고프실 거라 생각이 들어 선뜻 받을 수 없었다. 마음만 받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사코 거절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제가 이거 맛있게 먹을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음주 안하시고 진료소 와주시기로 약속하는 거에요!”라는 말로 내 고마운 마음을 대신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참이나 초코우유 병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더운 날씨에 얼마나 꼭 쥐고 서계셨는지 초코우유는 차가운 냉기를 다 잃어버린 채였다. 아버님이 진료소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병 안에 꾹꾹 눌러담으셨을 미안함과 고마움이 그대로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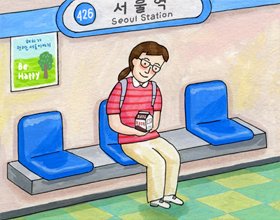
뜨뜻미지근했던 그날의 초코우유는 내가 맛본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버님께서는 “오늘은 술 안마시고 왔어”하시면서 밝은 얼굴로 진료소를 찾아주셨다. 약도 꼬박꼬박 챙겨드시겠노라 약속하시면서. 그 여름이 내게 달콤함으로 기억 되는 것은 아마 그날의 추억 때문일 것이다.

